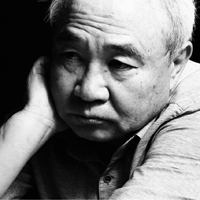
며칠 전에 고등학교 동기동창 친구들과 강원도 인제에 다녀왔네. 젊었을 때 3년 동안 군 복무를 했던 현리에서 가까운 방태산에 들렸는데 단풍이 절정이더군. 붉게 물든 계곡 단풍을 보면서 한 친구가 말하더군. ‘산이 불타고 있어!’ 고희가 가까운 노인의 입에서 나오기 힘든 멋있는 표현이라고 너도 나도 따라 하면서 낄낄거렸지. 하지만 며칠 지나면 저렇게 아름답게 물든 나뭇잎들도 낙엽이 되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우울해지더군. 그때 한 친구가 내 마음의 변화를 알고나 있는 것처럼 가을은 멀리 있는 게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노래했던 오세영 시인의 <가을에>를 큰 소리로 낭송하더군. 멋진 순간이었네.
너와 나/ 가까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봄이라 한다./ 서로 마주보며 바라보는 눈빛,/ 꽃과 꽃이 그러하듯…// 너와 나/ 함께 있는 까닭에/ 우리는 여름이라 한다./ 부벼대는 살과 살 그리고 입술,/ 무성한 잎들이 그러하듯…// 아, 그러나 시방 우리는/ 각각 홀로 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멀리서 혼자 바라만 본다는 것,/ 허공을 지키는 빈 가지처럼…/ 가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름다운/ 계절이다.
오세영 시인은 <원시(遠視)>라는 시에서도 “멀리 있는 것이 아름답다”고 노래했네. “무지개나 별이나 벼랑에 피는 꽃이나/ 멀리 있는 것은/ 손에 닿을 수 없는 까닭에/ 아름답다.”그러면서 “늙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것이다./ 머얼리서 바라볼 줄을/ 안다는 것이다.”라고 끝을 맺어. <가을에>와 <원시>에서 가을은 노년의 은유야.
만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봄은 인간의 생애주기로 따지면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해당한 계절일세. 부모 형제 및 또래 친구들과 가까이서 서로 마주보며 살아가는 기간이지. 신록이 우거지는 여름은 “살과 살 그리고 입술”을 비비대며 정력적으로 살아가는 청년기와 중년기에 해당하는 계절이야. 사람과 사람이 서로 비비고 부딪치면서 가장 정열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이지. 사랑의 표현 방식도 봄과 여름이 다르네. 청소년기까지는 ‘눈빛’을 통해 사랑을 주고받지만 청년이 되면 사랑도 격렬해지네. ‘부벼대는 살과 살 그리고 입술’이 함께할 때가 많아.
하지만 가을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지네. 장년기와 노년기에 해당하는 가을에는 눈도 침침해지고 기력도 약해지지. 자식들은 자기들 둥지를 찾아 집을 떠나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하나 둘 우리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네. 그래서 시인은 <원시>에서 “사랑하는 사람아,/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 내 나이의 이별이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지/ 멀어지는 일일 뿐이다.”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멀리서 혼자 바라만 본다는’ 게 분명 즐거운 일은 아니네. 아무리 좋은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아도 봄과 여름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기 어려워. 그러니 노년을 행복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을 계속 계발하고 키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감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고? 순전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렸을 때의 감수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네. 아름다운 풍경이나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말하고 슬픈 광경을 보면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해. 노인이 되면 어린애가 된다고 비웃는 사람들 있지? 그래도 난 그 말이 좋아. 비웃음이 아니라 칭찬으로 들리거든.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때 묻지 않은 어린이의 감수성을 다시 살려내야 하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워즈워드가 <무지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던 말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해. 그래야 안도현 시인처럼 “가을 햇볕 한마당 고추 말리는 마을 지나가면/ 가슴이” 뛰기도 하고, 최영미 시인처럼 가을이면 “그를 사랑한 것도 아닌데/ 미칠 듯 그리워질 때”가 있고“무작정 눈물이 날 때”도 있는 거네. ‘갓난아이’가 바로 도(道)라는 노자의 생각과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가르침일 걸세.
정희성 시인의 <가을날>로 끝내고 싶네. “길가의 코스모스를 보고/ 마음이 철렁했다/ 나에게 남은 날이 많지 않다/ 선득하니,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그림자가 한층 길어졌다.”앞으로 몇 번의 가을을 더 만날 수 있을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을 단풍과 하늘을 즐길 수 있는 날은 며칠이나 될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천 일이 되지 않을 걸세. 그러니 지금 붉게 타오르는 단풍들을 보면서 ‘참 좋다!’고 마냥 감탄하면서 시시덕거릴 수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