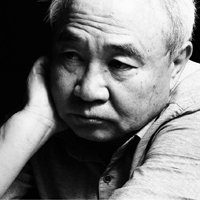
[시사위크] 먼저, 내가 기분이 울적할 때 자주 읊는 황인숙 시인의 <말의 힘>이네. 혼자 중얼거리지 말고 가슴 확 펴고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세.
기분 좋은 말을 생각해보자./ 파랗다. 하얗다. 깨끗하다. 싱그럽다./ 신선하다. 짜릿하다. 후련하다./ 기분 좋은 말을 소리내보자./ 시원하다. 달콤하다. 아늑하다. 아이스크림./ 얼음. 바람. 아아아. 사랑하는. 소중한. 달린다./ 비!/ 머릿속에 가득 기분 좋은/ 느낌표를 밟아보자./ 느낌표들을 밟아보자. 만져보자. 핥아보자./ 깨물어보자. 맞아보자. 터뜨려보자!
어떤가? 기분이 상쾌해지지 않는가. ‘말의 힘’이 강한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주는 시일세.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네만, 정녕 우리 모두 기분 좋은 일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말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언젠가 이 칼럼에서 인용했던 짧은 시에서 이해인 수녀도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라고 노래했었네. 수녀님도 말의 힘을 실감한 거지.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말로 채워진 세상에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거칠고 독한 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막말들이 횡행하는 아수라로 변하고 있을까?
요즘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내뱉는 독설과 악의가 가득 찬 거짓말들을 듣고 있으면 우리 사회의 언어가 거칠어지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도 같네. “독재 타도, 헌법 수호”“좌파 독재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패스트트랙 시도는 결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조선반도에 실현해서 소위 고려연방제를 하겠다는 게 목표며 좌파정변이자 좌파반란”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저런 언어로 시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참 한심한 사람들이야.
국회에서 회의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자기들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로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어기고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까지 반독재 투쟁을 하겠다니 자가당착이지. 자기들이 만든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니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일세. 그들이 내뱉는 독한 말들을 듣고 있으면 무슨 대단한 투쟁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본래 제 것이 아닌 것을 내 놓기 싫어 떼를 쓰고 있는 처연한 몸부림일 뿐이야. 그러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동물국회’의 주연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
한 시대의 말이 거칠다는 건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강팔라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 노자의 말대로, 죽음의 무리들이 득세하고 있는 거지. 많이 배운 자들,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 받아 일하는 자들이 먼저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사회 전체가 밝아지는 법인데, 그들의 말이 일반 시민들보다 더 거칠고 폭력적이니 세상이 더 험악해질 수밖에. 그런 자들이 국민들의 대표자 노릇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인데 이마저도 거부하면서 ‘좌파 독재’, ‘좌파 반란’같은 철지난 빨갱이 낙인만 찍고 있으니… 국민들을 우습게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일세.
며칠 전 친구들과 함께 찾은 운길산 수종사 마당에서 저 멀리 두물머리를 바라보고 서 있는 묵언(黙言)이라고 적힌 푯말을 만났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출발해 먼 길을 달려온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났으니 서로 할 말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 두 강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묵묵히 깨우치고 있는 푯말처럼 보여 절로 숙연해지더군. 지금 우리는 너무 말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욕설과 혐오의 말들이 오가는 아수라장에 살고 있어.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거친 말과 혐오의 말들이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네. 화가 나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 결국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고.
법정 스님의 <산에는 꽃이 피네>에서 읽었던 글일세.
“불교 경전은 말하고 있다. 입에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을 전부 말해 버리면 말의 의미가, 말의 무게가 여물지 않는다. 말의 무게가 없는 언어는 상대방에게 메아리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