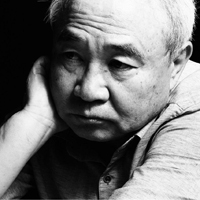
보름 전에 먼저 세상 떠난 친구 묘소에 다녀왔네. 고등학교 때 만나 아주 가깝게 지내다가 서른 살이 넘어 여기서는 말하기 어려운 일로 멀어져버린 친구지. 강원도 깊은 산속 공원묘지에 있는 그의 무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니 철없던 시절 그와 함께 도모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군.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하는 영원한 친구로 살아갈 것 같았던 우리들 관계가 왜 그렇게 어긋나고 망가졌을까? 그의 무덤에 소주 한 잔 따르면서 크게 후회했네. 그가 살았을 때 만나 소주잔 주고받으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떠나보낸 것을…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평생 살면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지.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처신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하는 거야.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 관용도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흔히 자기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네. 그래서 남들의 잘못을 쉽게 용납하지 못하지. 임승유의 <길고 긴 낮과 밤> 이라는 시일세.
우리가 사과를 많이 먹던 그해 겨울에 너는 긴 복도를 걸어와 내 방문을 열고// 사과 먹을래// 물어보곤 했다. 어느 날은 맛있는 걸로 먹을래 그냥 맛으로 먹을래 그러기에 네가 주고 싶은 것으로 아무거나 줘 말해버렸고// 오래 후회했다.// 그날 사과에 대해 우리가 갖게 된 여러 가지 사과의 맛과 종류에 대해, 다양한 표정과 억양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 시의 화자처럼 나도 오래오래 후회할 것 같네. 친구야 하고 부르면서 왜 먼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을까? 죽은 친구가 우리 사회의 규범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을 때 그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지난 1월 뇌졸증으로 쓰러질 때까지 그 친구 마음도 결코 편하지만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다양한 표정과 억양으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그냥 떠나보낸 게 아쉽고 마음이 아파.
그만 일로/ 죄면할 게 뭐꼬/ 누구나/ 눈 감으면 간데이./ 돈/ 돈/ 하지만 돈 가지고/ 옛 정情 살 줄 아나./ 또 그만 일로/ 송사訟事 할 건 뭐꼬/ 쑥국 끓이고/ 햇죽순 안주 삼아/ 한 잔/ 얼근하게 하기만 하면/ 세상에/ 안 풀릴 게/ 뭐 있노/ 사람 살면/ 백년百年 살 건가, 천년千年을 살 건가./ 그러지 말레이/ 후근후끈 아랫목같이 살아도/ 다 못사는 사람 평생/ 니/ 와 모르노.
박목월의 시 <대좌상면오백생(對坐相面五百生)>일세. ‘대좌상면오백생’이라는 꽤 어려운 제목은 사람이 서로 마주하고 앉아 이야기하려면 오백 번 태어나고 오백 번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뜻이야. 사람들의 만남과 인연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있다고나 할까. 저 시를 읽으면서 가족과 친구는 얼마나 더 많은 생멸의 과정을 거쳐서 만난 사이일까 생각하네. 분명 천생(千生)이 넘는 생과 사의 순환이 필요한 관계일 걸세. 이제 자네와 나를 포함한 우리 또래집단이 건강하게 살아갈 날은 20년도 채 남지 않았네. 그러니 새로운 사람 만나 우리들처럼 미운 정 고운 정 쌓기도 쉽지 않지. 우리 모두 부족한 게 많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며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인임을 잊지 말고 살자고.
정채봉 시인이 <수도원에서>에서 “미움이란/ 내 바라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이제야 알겠네”라고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미워지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일 때가 많아. 물질적인 것이든 마음이든,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상대가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미워지는 거야. 하지만 우리 이 나이에 더 바랄 게 뭔가. 설사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는 친구가 있어도 그냥 허허 웃고 지나칠 나이일세. 나 아닌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필요도 없고. 괴테가 <용기>라는 시에서 읊었던 것처럼, “신선한 공기/ 빛나는 태양/ 맑은 물,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만 있으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나이네.
가족이든 친구든‘옆에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을 가슴에 되새기며 공원묘지 급경사 비탈길을 내려오는데 길섶에 새로 핀 붉은 참나리 꽃들이 멀리멀리 따라오면서 활짝 웃으며 배웅하더군. 친구나 사랑했던 사람은 죽어서도 어디를 가든 졸졸 따라다니고, 맑은 시냇물에 다정한 얼굴을 살짝 내밀기도 하고, 억새에 붙어 노래도 부르고, 봄에 피는 풀꽃 안에서 싱긋 웃기도 한다는 말이 떠올라 잠시 가슴이 찡했네. “그래. 편히 쉬어라.” 나도 따라 웃을 수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