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이자 ‘임산부의 날’이다.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날이 같은 날짜에 겹친 것은 단순한 우연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임신부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임신부의 정신건강이 아이의 발육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논문 등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여성 정신건강 분야에 저명한 미국 정신과 의사 마들렌 베커(Madeleine Becker)가 2016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산모의 우울증은 △조산 △저체중아 출산 △태아 성장 제한 △산후 정서 합병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산후 기분장애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과거 우울증 병력이며, 임신 중 우울증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 ‘산후’에 초점 맞춰진 국내 조사… 소외 받는 임신부 정신건강
임신은 축복 받은 일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입덧을 시작으로 생체리듬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부담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정신적‧심리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럼에도 사회의 관심은 주로 출산 이후 여성에게 쏠려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1에 근거해 3년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진행하지만, 임신부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9월 30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임산부 정신관련 조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내 각종 연구‧보고서 역시 대체로 ‘산후 우울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에 임신부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을 다룬 국내 공공 차원의 대규모 실태조사나 장기추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영향일까. 지난 2013년 정신질환의 분류와 진단 기준이 대폭 개편되면서 ‘산후 우울증’이 ‘주산기 우울증’으로 정식 용어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산후 우울증’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다.
이와 관련 전(前) 국립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이수영 자문위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임신 중 우울증이 산후 우울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꽤 있기에 임신 시기부터 당연히 관찰이 필요하다”며 “정신과 교과서에 예전에는 ‘산후 우울증’이라고 표기했지만, 약 10년 전 정신과 교과서가 크게 바뀌면서 ‘주산기 우울증’으로 정식 용어가 바뀌었다. 아직 우리 사회에 낯선 단어인데 주산기 우울증이 임신 중과 산후를 포괄하는 단어다. 가장 보수적인 교과서 속 용어가 바뀐 것부터 임신 시기의 정신건강이 중요하다고 드러내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 임신부 10명 중 1명 우울증 경험… “가볍게 지나칠 문제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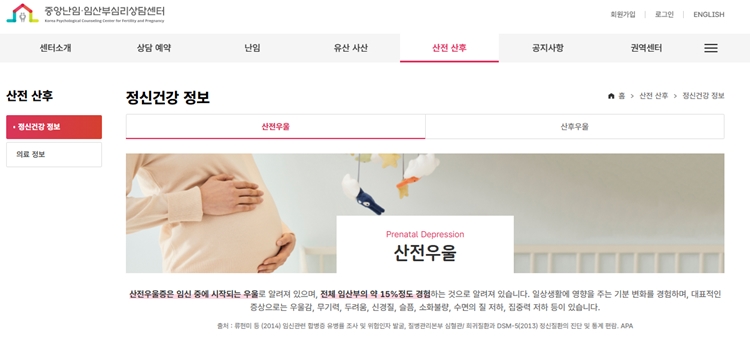
임신부 상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인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산전우울증은 임신 중에 시작되는 우울로, 전체 임산부의 약 15% 정도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14년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임신관련 합병증 유병률 조사 및 위험인자 발굴’에 근거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를 고려한다면 10년 전 데이터를 근거로 한 수치는 현대 임신부의 정신건강 현황을 객관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
다만 산전 우울증의 전 세계 유병률은 19.2%로 추산되고 있으며, 산전 불안‧우울로 인한 장애 유병률은 10~29.6%로 보고되고 있다. WHO 역시 임신부의 약 10% 정도가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WHO는 임신 중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을 자살로 지목하며, 신생아에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WHO는 △임신‧출산 이후 여성의 심리사회적 안녕 증진 및 정신 질환 예방 △모성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근거 및 연구 강화 △지역사회 기반 환경에서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 및 비용 효과적, 인권 중심의 사회적 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모성 정신건강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전명욱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임산부우울증상담센터장은 시사위크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임신 중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흔히 발생한다. 오히려 생애 처음으로, 혹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마음건강 문제를 이 시기에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런 어려움은 단순히 산모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가족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에도 파급되고, 태아의 건강과 발달과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며 적절한 시점에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신부의 우울과 불안은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문제이고, 최근 몇 년 사이 상담 현장에서는 이를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다른 건강 문제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임신 중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혼자 견디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할지 고민되는 순간이라면 그 자체로 상담을 받아볼 이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임신 중 우울 수준과 사회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성
|
2008.07 |
한국모자보건학회 |
Depression During Pregnancy and Postpartum
|
2016.02 |
Springer Nature |
임신 중 우울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2021.06 |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Women in the Last Trimester of Pregnancy: A Cross-Sectional Study
|
2023.05 |
MEDICIN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