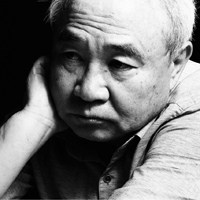
며칠 전 양평에 있는 소리산 계곡에 꽃구경을 갔다가 백작약의 꽃을 보았네. 카메라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야생화를 찍기 시작한 후 15년 만에 보고 싶었던 꽃을 만났으니 얼마나 흥분했겠나. 한참 동안 멍 때리는 사람처럼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네. 집 근처 야산에서 해년마다 만나는 꽃들을 보면 옆에 앉아 예쁘다는 말을 몇 번씩 하는데 백작약 흰색 꽃 앞에서는 그런 말이 바로 튀어나오지 않더군. 그때 생각난 시가 이명윤 시인의 <가슴이 쿵쿵거리는 까닭>이었어. 50여 년 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정말 예뻐!”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가슴만 쿵쿵거리던 소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험을 했다고나 할까.
“세상에는 아.름.답.네.요. 멋.있.어.요. 하며 치장한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지만 진정 아름다운 것을 보면 입은 말문(門)을 닫고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어쩌면 입보다 말은 먼저 알고 있다 당장 뛰쳐나가고도 싶지만 그의 요란한 발굽에 그의 뒤뚱거리는 몸짓에 그가 일으키는 바람에 혹시라도 아름다운 그것이 놀라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말은 門앞에서 스스로 짧은 비명으로 멈춰선 뒤 발길을 돌려 가슴이라는 초원에서 숨이 차도록 뛰어 다니는 것이다.”
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네. 세상에는 인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억지로 말로 형상화하려다 보면 진실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 게다가 말이 많으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많이 하게 되네.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해야 되고.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이 많은 자는 참으로 알지 못하고(언자부지 言者不知), 말이 많은 자는 착하지 않다(변자불선 辯者不善)고 말했지. 희언자연(希言自然), 말을 아끼고 저절로 그러함에 맡겨라는 게 노자의 가르침이야.
말이 많은 세상은 동시에 거짓이 많은 세상일세. 특히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말이 많다는 건 그 나라에 문제가 많다는 징후야.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다시 읽고 있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말이라고 믿고 싶지 않는 말들이 너무 많아. 50여 년 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매주 월요일이면 운동장에서 있었던 조회 시간이 생각나네. 쨍쨍 내리쬐는 땡볕 속에서 교장 선생님의 길고 지루한, 지금 생각해도 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던 고리타분하고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훈화말씀을 듣고 있던 무표정한 동무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대통령이 아는 게 많아서 말이 많다는 대통령실 인사의 웃고픈 해명을 들으면서 도올 김용옥 선생이 『노자가 옳았다』의 마지막 장에서 박자부지(博者不知)를 해설하면서 했던 말이 생각났네. “이 세상 사물을 너무 많이 아는 자들은 참다운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특히 정치 지도자의 박식은 질병이다. 박식하기 때문에 암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고, 참모를 거느릴 수 있는 역량의 인간이 되지 못한다. 정치가에게 박식은 쥐약이다. 폼만 잡다가 아무 것도 못한다. 이것은 나 도올의 말이 아니라 노자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지막 충언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부추긴 정치사회적 반목과 갈등,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극우세력의 목소리 등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시끄러운 나라가 되어버렸네. 말이 말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침묵이 금이라는 격언이 고어가 된지 오래야. 눈으로 보고 눈으로 말하는 법, 너무 좋은 것은 가슴에 담아두는 법을 알았던 우리 나이의 노인들마저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러니 미국 시인 제프리 맥다니엘이 <고요한 세상>이라는 시에서 말한 ‘167자법’이 생각날 수밖에.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의 눈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하고/ 또 침묵을 달래 주기 위해/ 정부는 한 사람당 하루에/ 정확히 백예순일곱 단어만 말하도록/ 법을 정했다.// 전화가 울리면 나는 ‘여보세요’라는 말 없이/ 가만히 수화기를 귀에 댄다./ 음식점에서는/ 치킨 누들 스프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나는 새로운 방식에 잘 적응하고 있다.// 밤 늦게 나는/ 멀리 있는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스럽게 말한다./ 오늘 쉰아홉 개의 단어만 썼으며/ 나머지는 당신을 위해 남겨두었다고.// 그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면/ 나는 그녀가 자신의 단어를 다 써 버렸음을 안다./ 그러면 나는 ‘사랑해’ 하고 천천히 속삭인다./ 서른두 번 하고 3분의 1만큼./ 그 후에 우리는 그냥 전화기를 들고 앉아/ 서로의 숨소리에 귀 기울인다.
하루에 167개 단어만 말해야 하는 법이라니, 재미있지 않는가. 그냥 웃을 일만은 아닐세. 휴대폰과 SNS, 국민들 울화만 치밀게 만드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말 등으로 시끄러운 세상을 사람들이 서로 눈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침묵 하면서 서로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