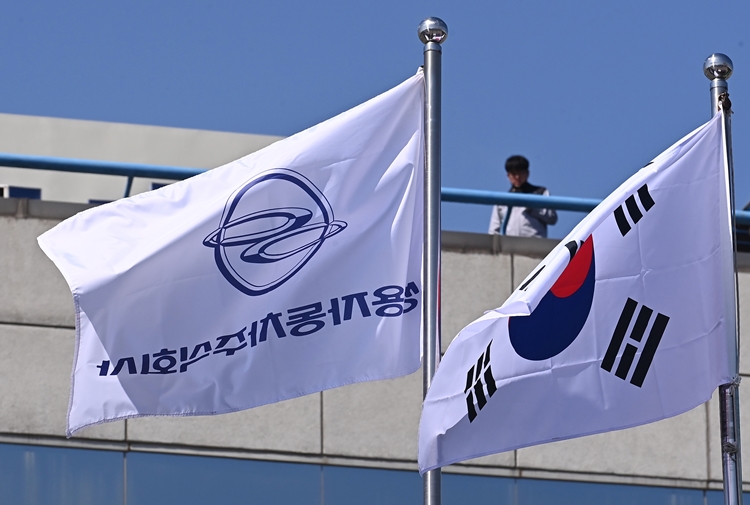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15년 전, 사회적으로 큰 파문과 상처를 남겼던 ‘쌍용차 사태’에 따른 노조의 배상책임 범위가 사실상 확정됐다. 당초 33억원에 달했던 것이 21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는 지난 13일,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20억9,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의 발단은 15년 전인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쌍용차는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다 법정관리에 돌입했으며,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이에 노조는 거세게 반발했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파업은 물론 공장 점거 및 물리적 충돌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쌍용차는 불법 점거 농성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 조합원과 금속노조를 향해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노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2016년 취하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금속노조에게 내려진 배상책임은 33억원이었다. 손해액을 55억원으로 산정한 뒤 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손해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손해액에 포함된 것 중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반영한 파기환송심은 손해액에서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했고, 역시 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20억9,0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여기에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노조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35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쌍용차가 요구한 손해배상 규모에 비해 배상책임이 크게 줄어들게 됐지만 여전히 상당한 액수다. 이에 따라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연이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쌍용차 손배 판결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 금속노조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며 “노동자가 손배로 죽지 않는 세상, 헌법상 파업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세상, 공권력에 의해 민주노조가 파괴당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